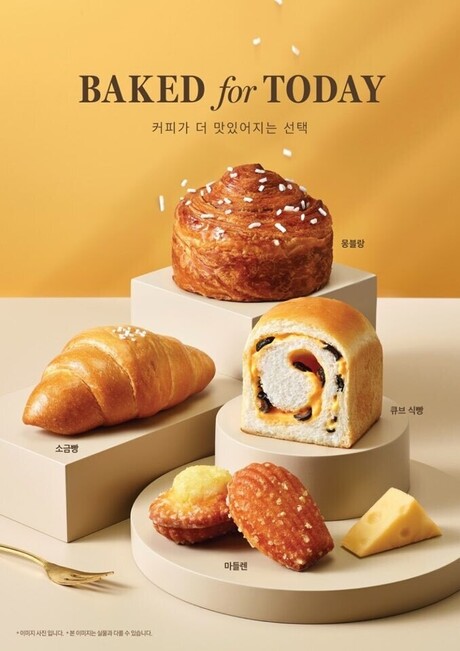낮과 밤이 같아지는 계절의 분기점
오늘(23일)은 추분(秋分)이다. 추분은 24절기 가운데 열여섯 번째 절기로, 백로와 한로 사이인 음력 8월에 찾아온다. 이 날은 태양이 추분점에 이르러 적도와 황도가 교차하면서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진다. 천문학적으로는 황경 180°에 해당하는 시점으로, 사자자리와 처녀자리 사이에서 태양이 위치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추분은 다른 절기처럼 명절이나 특별한 절일로 기념되지는 않지만, 춘분과 함께 계절의 뚜렷한 분기점으로 여겨졌다. 이 무렵부터 밤이 점점 길어지며, 여름의 기세가 꺾이고 본격적인 가을의 시작을 실감하게 된다. 전통적으로 사람들은 이 시기를 계절이 바뀌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인식하며, 농사일과 식생활 모두에서 가을걷이와 저장 준비를 본격화했다.
추분과 가을걷이, 풍요의 노동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추분은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수확하는 시기이기도 하다. 논밭에서는 벼와 곡식이 익어가고, 목화와 고추를 따서 말리는 일손이 분주하다. 호박고지, 박고지, 깻잎, 고구마순 등도 이맘때 거두어들여 겨우내 먹을 묵나물을 마련하는 풍습이 이어졌다.
한식진흥원은 추분을 “낮이 밤을 시샘하고, 밤이 낮을 시샘하는 계절의 분기점”으로 표현하며, 농가에서는 이 시기 고추를 말리고 호박과 박, 깻잎을 널어두는 풍경이 펼쳐졌다고 소개한다. 이는 단순히 저장의 의미를 넘어, 겨울을 대비하는 삶의 지혜이자 공동체적 리듬이었다.
추분 무렵의 바람과 날씨를 살피며 이듬해 농사를 점쳤다는 민속적 풍속도 전해진다. 건조한 바람은 풍년을, 흐린 날은 흉년을 의미한다고 믿었던 것이다. 절기의 변화가 곧 삶의 생존과 직결되었던 만큼, 추분은 단순한 천문 현상을 넘어 농경 사회 전체에 상징적 의미를 지닌 시기였다.
추분의 맛: 버섯과 나물, 그리고 바다의 선물
추분을 대표하는 시절음식은 버섯이다. 버섯은 숲과 들에서 풍성히 자라 가을 식탁에 오르며, 구워 먹거나 나물로 무쳐 먹어 향긋한 가을 맛을 더했다. 한식진흥원은 이 시기에 꼭 맛봐야 할 제철 식재료로 토란, 단감, 고구마, 표고버섯, 미역, 갈치를 꼽는다.
토란(土卵)은 감자와 고구마가 들어오기 전까지 귀한 탄수화물 공급원이자 단백질 원이었다. 땅에서 나는 알이라는 이름처럼, 알알이 영양이 가득 차 있다. 토란국, 토란탕, 조림 등으로 즐기며, 토란대는 섬유질이 풍부해 나물로 먹기도 한다. 단감은 가을의 상징적 과일로, 아삭한 식감과 달콤함으로 사랑받는다. 홍시와 곶감으로 이어지는 다양한 변신은 한국인의 가을을 더욱 풍요롭게 한다.
고구마는 서민의 배를 든든히 채운 주식이자 오늘날에는 디저트와 건강식으로 각광받는다. 줄기까지 삶아 나물로 먹는 풍습은 가을걷이의 알뜰한 미덕을 보여준다.표고버섯은 ‘땅에서 나는 고기’라 불릴 만큼 향과 맛이 깊다. 생으로도 먹지만, 말리면 아미노산이 풍부해져 국물 요리에 감칠맛을 더한다.
미역은 흔히 산후 보양식으로 알려져 있으나, 가을 미역은 ‘바다의 보약’이라 불리며 영양이 뛰어나다. 특히 기장, 완도, 진도의 미역은 지역별 특색을 지니며 가을 식탁을 더욱 건강하게 만든다. 갈치는 은빛 옷을 입은 가을 대표 생선으로, 7~10월이 제철이다. 고소하면서도 부드러운 살은 구이·조림·튀김 어디에나 어울려 ‘가을 바다의 선물’로 불린다. 이렇듯 추분 무렵의 제철음식은 땅과 바다가 동시에 내어주는 결실로, 가을걷이의 풍성함을 오롯이 담아낸다.
가을 밥상, 보양과 별미의 조화
한식진흥원은 추분의 밥상을 “풍년의 기쁨을 담은 식탁”으로 표현하며, 보양과 별미를 동시에 강조한다. 가을은 여름 내 지친 체력을 보충하고, 겨울을 대비해 기력을 북돋는 계절이다.
전복죽은 고단백 영양식으로 병후 회복에 도움이 된다. 특히 전복 내장을 함께 넣어 끓이면 깊은 풍미와 영양을 더해 가을철 대표 보양식으로 자리매김했다.꽃게무침은 매콤한 양념과 어울려 ‘밥도둑’으로 불린다. 고추, 마늘, 생강, 배를 곱게 갈아 넣은 양념은 가을 입맛을 확실히 돋운다.
이와 같은 별미는 풍성한 가을걷이의 기쁨을 나누는 자리에서 빠질 수 없는 음식이었다. 농사의 결실을 함께 맛보고, 이웃과 나누며 공동체적 유대를 다지는 의미 또한 추분 음식의 중요한 가치였다.
추분, 계절의 균형과 풍요를 담은 미학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천문학적 순간이자, 여름과 가을을 가르는 계절의 경계선이다. 한국 전통사회에서는 이를 단순한 시간의 흐름으로 보지 않고, 농사와 음식, 공동체의 삶을 묶는 계절의 지혜로 삼아왔다.
버섯, 토란, 고구마, 갈치와 같은 제철음식은 자연의 순환 속에서 얻은 선물이다. 추분의 밥상은 단순히 끼니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 호흡하며 계절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문화적 행위였다.
오늘날 바쁜 일상 속에서도 추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을 제철 음식을 식탁에 올리는 것은, 풍요와 감사의 마음을 되살리는 작은 의례라 할 수 있다. 낮과 밤이 균형을 이루는 순간, 우리 식탁 위에도 자연과 삶의 균형이 함께 차려지는 것이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