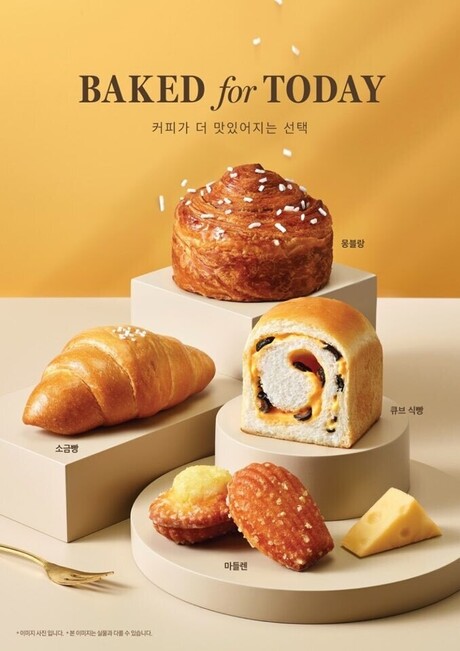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이경엽 기자] 오늘(29일)은 음력 7월 7일, 칠석(七夕)이다. 하늘의 은하수는 더욱 맑아지고 직녀성과 견우성은 서로 마주 본다. 전설 속 두 별이 까마귀와 까치가 놓은 오작교 위에서 만나듯, 인간 세상에서도 이 날은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칠석은 여름 한가운데서 마주하는 세시풍속이다.
이날은 단순한 연인의 날이 아니라, 농경 사회의 삶과 계절 음식이 빚어낸 지혜의 날이었다. 처녀들은 바느질 솜씨를 기원하고, 학동들은 시를 지으며 학업의 정진을 빌었으며, 가정마다 제물을 차려 무병장수를 기원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식탁 위에 오르는 칠석 음식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각 가정에서는 밀전병과 햇과일을 마련해 북두칠성에 장수를 기원했다고 한다. 또 김정숙 작가의 『열두 달 세시풍속과 절기음식』은 “칠석날은 밀전병·밀국수·시루떡·잉어 음식·오이김치·과일 화채를 만들어 먹었다”고 전한다. 그 밥상은 단순한 음식을 넘어, 더위를 견디고 계절을 이겨내는 여름철 마지막 향연이었다.
밀의 계절, 마지막 향연 ― 밀전병과 밀국수
칠석의 대표적인 음식은 단연 밀 음식이다. 초여름에 수확한 밀은 쌀과 보리가 떨어질 무렵 구황과 별미를 동시에 담당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칠석날 각 가정이 밀전병을 차려 올렸다고 기록한다.
밀전병은 오늘날의 부침개와 흡사하다. 밀가루 반죽에 호박, 부추, 파를 송송 썰어 넣고 번철에 지져내면 고소하면서도 산뜻한 맛이 난다. 김정숙 작가는 이를 “찬바람이 일기 시작하면 더 이상 먹지 않는, 여름의 마지막 밀 음식 잔치”라고 표현했다. 즉, 칠석은 밀전병의 계절적 종막선이었다.
또 다른 별미는 밀국수였다. 밀가루나 메밀가루를 뽑아낸 국수는 더위에 지친 몸을 식히기에 제격이었다. 장마철 눅눅한 공기를 뚫고 시원한 국수 한 그릇을 들이키는 것은 여름을 버티는 하나의 의식과도 같았다. 궁중과 민간에서 모두 즐겼던 밀국수는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존의 맛, 계절의 맛이었다.
오이김치, 여름의 시원한 선물... 햇과일과 화채, 별빛을 담은 그릇
여름철 가장 흔하면서도 귀한 채소는 오이다. 칠석날에는 이를 활용해 오이김치를 담갔다. 김정숙 작가는 “오이는 아삭한 질감과 산뜻한 향기로 밥상에 변화를 주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오이깍두기에 삶은 닭살을 버무린 ‘닭김치’가 최고의 술안주였다”고 전한다. 얼음에 차게 보관한 닭김치는 단백질과 채소가 어우러져 여름철 영양과 맛을 동시에 잡은 지혜의 음식이었다.
또한 ‘외소김치’라 불린 오이소박이, 오이비늘김치 등은 더위를 달래는 별미였다. 장독대 위에 정화수를 떠놓고 바느질 솜씨를 비는 풍습처럼, 오이김치는 생활과 기원의 한 부분으로 자리했다.
또 칠석날에는 햇과일을 바치는 풍습이 있었다. 복숭아, 참외, 수박 등 계절 과일은 여름의 풍요를 보여주는 증표였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가정에서 햇과일을 차려놓고 가족의 무병장수와 평안을 빌었다”고 전한다.
특히 과일 화채는 빼놓을 수 없는 별미였다. 김정숙 작가는 “복숭아화채 등 제철 과일을 갈아 즙을 내고, 건더기를 띄워 땀으로 빠져나간 수분과 비타민을 보충했다”고 설명한다. 달콤하면서도 시원한 화채는 단순한 후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의학적 음식이었다.
칠석날에는 시루떡을 쪄서 조상께 올리기도 했다. 햇벼가 익으면 사당에 천신하고, 우물고사를 지내며 우물을 청소하는 풍습도 있었다. 이는 농경 사회에서의 정화 의식과 맞닿아 있다.
또 김정숙 작가는 칠석 음식으로 민어를 언급한다. 7월은 민어의 제철이었고, 호박과 함께 전을 부치거나 말려 ‘암치’로 저장했다. 이는 여름철 단백질을 보충하는 동시에, 저장 식품으로서의 기능도 했다.
지역에 따라서는 잉어를 이용한 음식도 전해졌다. 강과 논에서 손쉽게 잡히는 잉어는 잔칫상에서 빠지지 않는 단백질원이자 풍요의 상징이었다.
오늘의 칠석, 잊힌 밥상을 다시 불러내며
칠석 음식은 단순히 ‘무엇을 먹었다’가 아니라, 어떻게 계절을 이겨냈는가의 기록이다. 밀은 초여름의 마지막 곡식, 오이는 여름의 청량감, 과일은 풍요의 증거, 화채는 건강의 보충제, 떡은 정화와 제사의 상징이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칠석이 “북두칠성에게 장수를 기원하는 날”이라고 말한다. 김정숙 작가 또한 음식 하나하나가 건강과 장수, 풍요와 소망을 담은 의례적 행위였음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칠석 음식은 여름을 마무리하고 가을을 준비하는 전환점의 밥상이었다.
오늘날 칠석은 공휴일이 아니기에 명절로서 의미가 많이 희석되었다. 많은 이들이 그저 전설 속 견우와 직녀의 만남을 떠올릴 뿐, 밀전병 한 장, 오이김치 한 접시, 화채 한 그릇에 담긴 여름의 지혜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그러나 기후 위기와 폭염이 일상이 된 지금, 칠석 음식은 다시금 되새겨볼 가치가 있다. 밀국수의 단순한 곡식 활용법, 오이김치의 시원한 발효 지혜, 화채의 수분 보충은 모두 지속 가능한 식생활의 힌트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칠석의 밥상은 단순한 전통이 아니라, 계절과 인간이 맺어온 공존의 기록이다. 그 기억을 되살리는 일은, 우리가 다시 여름을 건강하게 살아내는 방법을 찾는 길이 될 것이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