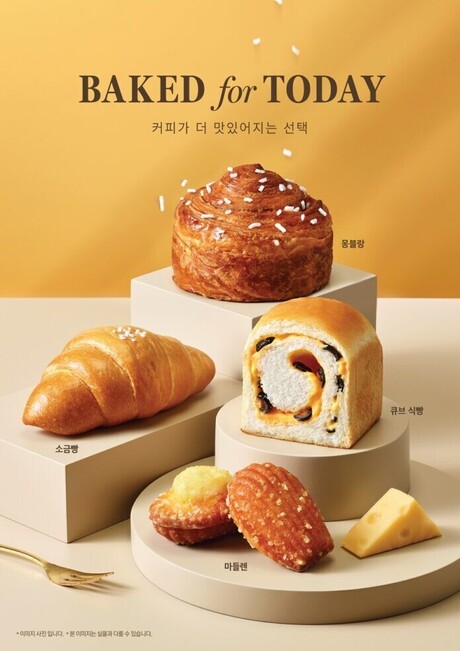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쌀값은 폭등이 아니라 회복 추세이며, 앞으로 더 올라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 하루 먹는 밥값이 500원 정도입니다."
24일 국정감사에서 나온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발언이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쌀값이 식당 밥값, 김밥, 도시락 등 외식 물가 전반을 뒤흔드는 '기준점'이라는 현실을 외면한 발언으로 들릴 수 있다.
하지만 이날 국감의 진짜 쟁점은 '농민 vs 소비자'가 아니었다. 쌀값 인상이라는 표면 아래, "내가 낸 돈이 과연 농민에게 제대로 가고 있는가"라는 소비자의 근본적인 불신, 그리고 그 불신의 원인이 되는 농협의 불공정한 내부 유통 구조가 드러났다.
"여주는 8만 5천 원, 진천은 6만 1천 원"... 소비자는 몰랐던 '벼값 로또'
이날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제기한 문제의 핵심은 '쌀값'이 아닌 '벼값'이다. 소비자는 '쌀'을 사지만, 농민은 농협에 '벼'를 판다. 그런데 이 벼 수매 가격이 지역마다 천차만별이다.
임 의원에 따르면 작년, 같은 '알찬미' 벼를 재배했는데도 차로 20분 거리인 경기도 여주에선 40kg당 8만 5천 원을 받았지만, 충북 진천에선 6만 1천 원을 받았다. 올해도 경기도는 8만 3천 원, 충남은 6만 4천 원으로 격차가 여전하다.
임 의원은 "(진천 농민은) 제 조상님 탓을 해야" 하냐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라고 질타했다. 이는 쌀값이 오르내리는 것과 별개로, 농민들 사이에서조차 수익이 공평하게 배분되지 않는 '유통 실패'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비자의 합리적 의심: "내 돈은 농민이 아닌, 농협의 적자를 메우고 있나?"
소비자 입장에서 "쌀값을 올려 농민을 돕자"는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 내가 낸 돈이 진천 농민이 아닌 여주 농민에게만 쏠리고 있다면, 그것은 공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격차는 농협 RPC(미곡종합처리장)의 시설과 경영 능력 차이에서 비롯된다. 저온 저장고 등 시설이 좋은 RPC는 벼를 비싸게 사서 보관했다가 '신선미'로 팔아 이익을 내는 선순환 구조에 진입했다. 반면, 시설이 열악한 RPC는 적자가 누적돼 벼값을 높게 쳐줄 여력이 없는 악순환에 빠졌다.
강 회장 역시 "적자를 많이 내다보니까 우리 조합장님들은 경영을 좀 보수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있는 게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소비자의 불신은 바로 이 지점에서 생긴다. "쌀값 인상분이 고생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협의 비효율적인 RPC 운영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는 것 아닌가?"
만약 이 불공정한 '벼값 로또'가 계속된다면, 진천의 농민들은 "조상 탓"을 하며 벼농사를 포기할 것이다. 강 회장이 "우리 농업의 62%가 수도작(벼농사)"이라고 언급했듯이, 국내 쌀 생산 기반이 무너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온다. 쌀 공급이 불안정해지고, 수입쌀에 의존하며 지금보다 훨씬 비싼 가격을 치러야 할 수도 있다.
결론: '가격 인상'보다 '신뢰 회복'이 먼저다
농협중앙회장으로서 강 회장이 "농업인을 위해서" 쌀값 인상을 주장하는 것은 그의 당연한 역할이다. 그는 "대형 마트가 아니라 우리 농협에서 하겠다" 며 가격 결정권을 가져오겠다고 선언했다.
하지만 소비자의 동의를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있다. 바로 '신뢰'다.
소비자는 쌀값 인상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그 돈이 '누구를 위해' 쓰이는지 명확하길 바랄 뿐이다. 농협은 쌀값을 올리자고 말하기 전에, 이 불공정한 RPC 격차부터 해소해야 한다. 쌀값 인상분이 특정 지역이 아닌 모든 농민에게 공평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비효율적인 유통 구조를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농민의 땀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길이며, 소비자가 기꺼이 "밥값 500원" 을 받아들일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