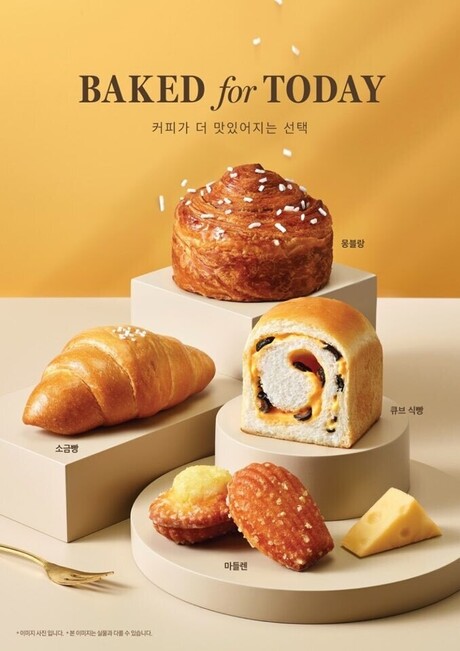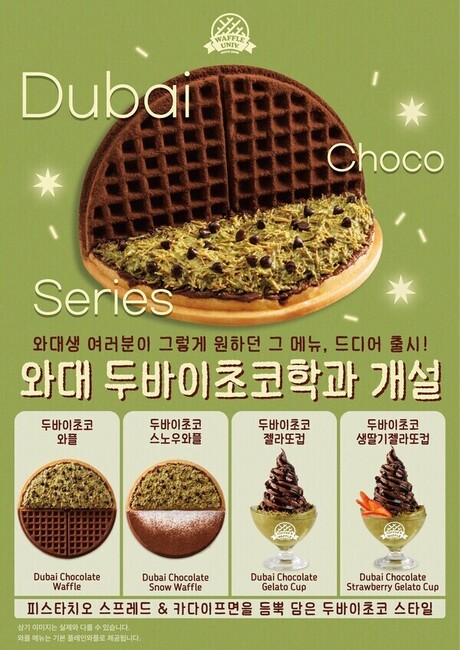농업 중심 청사진, 빠진 ‘외식업’—규모 대비 정책 공백
[Cook&Chef = 이경엽 기자] 정부는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국정과제 관리기획’을 확정했다. 이재명 정부 123대 국정과제와 농식품부 4대 과제는 먹거리 안정·농정 대전환·농산어촌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5년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그러나 문서 어디에도 외식업을 독립 산업으로 규정하거나, 조리사·셰프·외식 서비스 혁신을 별도 과제로 다룬 흔적은 없다. 이 공백은 산업의 실제 규모와 대비할 때 더욱 선명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음식점 및 주점업’은 79만 3,586개 사업체, 211만 6,987명 종사자, 191.7조 원 매출을 기록했다. 이 가운데 음식점업만 보더라도 56만 2,916개 사업체, 160만 9,134명 종사자, 159조 원 매출로 내수 고용과 창업 생태계를 떠받치는 핵심 축이다. 그럼에도 국정과제에는 외식업 전용 정책 라인이나 인력·기술·서비스 혁신 패키지가 빠져 있다.
농업과 유통 구조 개선은 분명 먹거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다. 하지만 최종 접점인 외식 서비스(메뉴·위생·경험·가격)의 질을 높이는 제도적 장치가 함께 설계되지 않으면 효과는 반감된다. 생산자 중심에 치우친 정책 틀은 조리·서비스 분야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와 일자리 질(숙련·경력경로·임금) 개선을 뒷전으로 밀어낼 위험이 크다.
소비자와 조리사에 미치는 파장—물가·지출·체감도
외식 물가는 팬데믹 이후 급등기를 지나 다소 완화됐지만 여전히 높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8월 ‘음식 및 숙박’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1% 상승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분석 역시 외식 물가 상승률이 2024년 3.8%에서 2025년 3.0%로 둔화됐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완만한 둔화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체감 부담은 줄지 않았으며, 가격 안정의 ‘마지막 관문’은 외식업 현장의 원가·인력·임대료 구조 개선에 달려 있다.
가구당 월평균 ‘음식·숙박’ 지출은 2024년 4분기 기준 45만5천~46만8천 원으로 전년 대비 5% 안팎 증가했다. 생활지출에서 외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만, 국정과제에는 소비자 권익·가격 안정·품질 제고를 외식 서비스 차원에서 보장할 장치가 거의 없다.
조리사와 셰프도 사각지대다. 장시간 노동, 낮은 임금, 불안정 고용 등 구조적 난제는 여전하지만, 이번 국정과제 어디에도 인력 지원이나 직업 안정성 개선은 담기지 않았다. 선진국 다수가 ‘미식 관광’을 전략 산업으로 삼아 레스토랑과 셰프를 도시 브랜드 자산으로 육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의 정책 로드맵은 외식·조리 인력과 서비스 혁신을 외면하고 있다.
K-푸드 시대의 정책 과제—‘먹거리=농업’ 프레임을 넘어
정부는 K-컬처와 관광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K-푸드와 미식관광을 국가 브랜드로 키우기 위해서는 농업 중심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외식업은 음식의 최종 경험을 제공하는 플랫폼이며, 조리사는 그 경험을 창조하는 주체다.
외식업을 단순히 ‘소상공인’이나 ‘서비스업’의 하위 항목으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문화·관광·산업을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 지역 로컬 푸드를 활용한 외식업 활성화, 조리 인력 양성과 직업 안정성 강화, 미식 소비자의 권익 보호는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은 이미 ‘미식 관광’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제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도쿄는 미쉐린 가이드와 관광 정책을 연계해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였고, 파리는 셰프 네트워크를 문화 콘텐츠로 확장했으며, 방콕은 ‘거리 음식’을 국가 관광 상품으로 제도화했다. 반면 한국의 국정과제는 여전히 ‘농업=먹거리’라는 전통적 프레임에 갇혀 있어 외식업을 통한 문화·경제적 파급력을 제약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향후 후속 대책을 마련하면서 외식업과 조리사, 미식 소비자를 정책 논의 전면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농업 중심 먹거리 전략을 넘어, ‘음식을 만드는 사람’과 ‘음식을 소비하는 사람’을 함께 아우르는 통합적 비전이야말로 K-푸드 시대의 진정한 국정과제가 될 것이다.
정책 메시지의 균형, 지금이 보완 타이밍
현재 국정과제는 생산자 중심 먹거리 전략에 무게를 두었다. 그러나 외식업·조리사·소비자라는 서비스 축이 빠진다면, K-푸드 시대의 성장 동력은 제한된다. 산업 규모, 물가, 지출이 보여주는 현실을 국정 어젠다에 반영해, 현장 효용 중심의 외식 정책 라인을 서둘러 보완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먹거리 국가전략’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