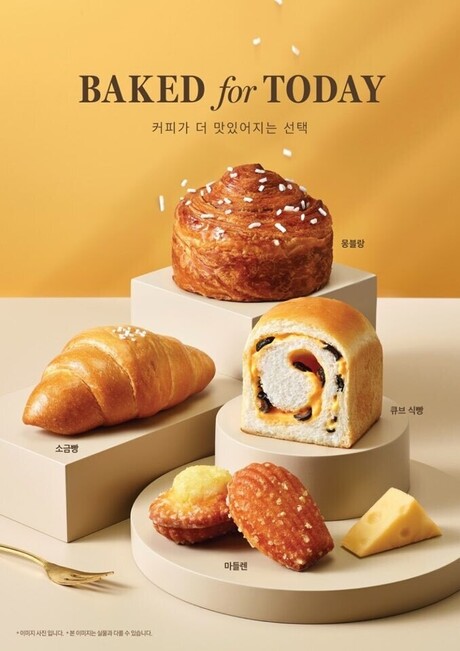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오늘(9일)인 말복(末伏)은 삼복의 끝이자 여름의 마지막 복날이다. 입추가 지났지만 바람은 아직 후덥지근하고, 대지 위로 눌러앉은 열기는 쉽게 물러가지 않는다.
조선의 궁중에서는 더위가 정점에 달하면 세자의 강독도 멈췄다고 한다. 《중종실록》에 기록된 “한더위라면 3일을 넘기더라도 무방하다”는 세자 사부의 아뢰음은, 단순한 날씨 문제가 아니라 생존을 위한 순응의 태도였음을 보여준다.
사람들은 피서를 떠났고, 산과 계곡에선 술과 음식, 제철 과일을 나누었다. 지금도 여름휴가는 삼복 무렵에 가장 몰린다. 현대인이 느끼는 피로와 생리, 계절의 리듬은 오래된 풍속과 여전히 연결돼 있다. 말복은 단순한 ‘더운 날’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시간을 견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작고 소중한 쉼표다.
여름의 밥상, 계절을 먹다
지명순 작가의 『당신의 식사는 안녕하십니까』에 따르면, 복날 무렵 가장 좋은 보양식은 장맛비 이후 땅에서 자란 제철 과일과 채소다.
수박은 당도가 절정에 달하고, 참외는 은은한 향으로 입맛을 깨우며, 복숭이는 피로를 덜어주며 무기력한 여름 한가운데를 달래준다.
옥수수는 탄수화물과 단백질, 미네랄이 조화된 대표적인 곡물로, 삶거나 구워도 좋고 죽으로도 즐긴다. 오이냉국은 잘 익은 오이와 초간장을 차갑게 섞어 만든, 여름철 위장에 스며드는 청량한 음식이다.
지 작가는 “더위를 이기는 데는 수분이 많은 과일만 한 음식도 없다. 마침 장마 뒤에 찾아오는 대서 즈음엔 과일 맛이 가장 달고 좋다.”고 말한다. 이런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는’ 것을 넘어, 계절의 흐름에 맞춰 우리 몸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말해준다. 여름철 밥상은 몸의 언어이자 생존의 지혜다.
양반의 임자수탕, 서민의 콩국수
김정숙 작가의 『열두 달 세시풍속과 절기음식』에 따르면, 복날 음식은 신분과 계층에 따라도 갈렸다.
양반가에서는 ‘임자수탕(荏子水湯)’이 여름철 대표 음식이었다. 들깨를 곱게 갈아 뽀얀 국물을 만든 뒤, 영계를 푹 삶아 섞은 이 탕은 고소하고 영양이 풍부한 냉국이다. 고급스럽고 섬세한 맛이 특징이며, 사치와 미식의 경계에 있는 음식이었다.
반면 서민들은 개장국을 먹었고, 19세기 말이 되어서야 비로소 쇠고기로 대체한 ‘육개장’이 양반가에 등장했다. 육개장은 양지머리를 삶아 찢고 고사리, 숙주, 토란대, 파 등을 넣고 고춧가루와 들기름으로 진하게 끓인 탕이다. 이열치열의 원리가 담긴, 여름을 겨냥한 음식이었다.
콩국수는 서민들의 대표적인 여름 별미였다. 뽀얀 콩물을 곁들인 차가운 국수는 입맛을 깨우고, 무더운 날에 허기진 몸에 단백질과 활력을 동시에 채워주었다. 황해도 지방에서는 수수경단을 콩국에 띄워 먹기도 했다는 기록이 전한다. 『시의전서』에 기록된 콩국수와 깨국수는, 이미 1800년대 말에도 여름 보양식이 널리 먹혔음을 증명한다.
지역이 만든 말복의 풍경
복날 음식은 지역마다 다르다. 충청도에서는 민어국, 경상도에서는 흑염소 수육, 전라도에서는 육개장이나 추어탕이 복날 밥상에 오르기도 한다. 황해도처럼 수수가 풍부한 지역에서는 수수경단을, 경남 해안에서는 붉은 고추를 넣은 장어구이나 장어덮밥이 주요 메뉴였다.
제철 오이를 이용한 오이냉국도 지역별로 조리법이 다르다. 어떤 지역은 된장을 풀고, 어떤 지역은 식초·설탕으로 단맛과 신맛을 조화시켰다. 또 '복달임국'이라 하여 된장국에 두부, 마늘, 대파를 넣고 진하게 끓인 국도 존재한다.
이처럼 복날은 단순히 ‘삼계탕의 날’이 아니라, 지역성과 풍속, 입맛과 재료가 만들어낸 풍경의 날이다. 그 지역의 기후, 농산물, 삶의 방식이 한 상의 음식에 담긴다.
말복 이후, 식탁은 계절을 예고한다
말복은 여름의 끝이자 가을로 가는 문턱이다. 복날 이후 바람의 온도가 달라지고, 아침 공기에 이슬이 느껴진다. 입맛은 점차 뜨거운 국물이나 곡물 위주로 바뀌고, 과일이나 냉채 중심 식단은 점점 자리를 내어준다. 이는 단순한 식단 변화가 아니다. 그것은 몸과 자연이 교감하는 방식이자, 우리가 계절과 대화하는 방식이다. 여름을 견디고, 다음 계절을 준비하는 이 지점에서 식탁은 매개가 된다.
말복은 한 계절을 견뎌낸 이들에게 주는 작은 위로이자, 다음 계절로 무사히 나아가기 위한 다짐이다.
보양은 영양의 문제만이 아니다. 계절에 순응하고, 가족과 음식을 나누며, 스스로를 살피는 방식이다. 말복 밥상 위에는 땀의 기억이, 공동체의 온기가, 그리고 계절을 넘어가는 지혜가 담겨 있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