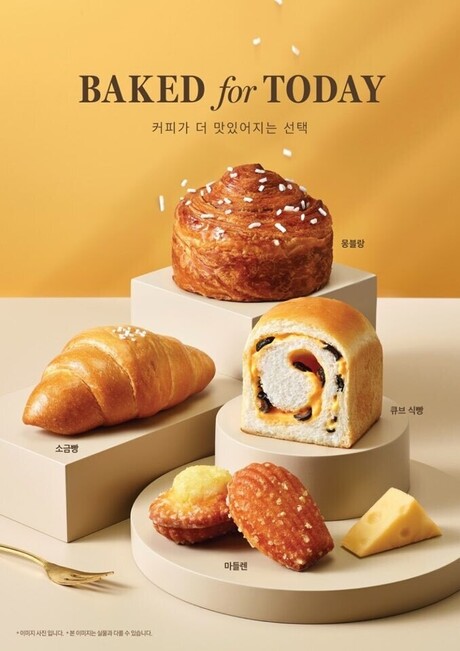이미지 생성: ChatGPT (OpenAI) 제공 / Cook&Chef 제작
[Cook&Chef = 이경엽 기자] 오늘(음력 윤 6월 15일)은 두 번째 유두절이다. 올해는 윤6월이 끼인 해로, 유두절도 윤달에 맞춰 찾아왔다. 예로부터 윤달은 "한 번 더 돌아온 달"로 여겨졌고, 유두절 역시 자연스레 윤6월 15일에 맞춰 지내는 풍속이 있었다. 이중달 속에 다시 돌아온 유두는 마치 계절의 뒤안길에서 다시 한 번 손을 내미는 듯한 느낌을 준다. 두 번 맞는 유두가 주는 의미는 그만큼 삶을 두 번 들여다볼 수 있는 여유와 감사의 시간이다.
짙게 눅눅해진 땅 위로 더위가 깃든다. 매미 소리에 섞인 바람의 온도가 조금은 무겁게 다가오는 여름의 중심, 우리는 유두(流頭)를 맞는다. 음력 6월 보름, 땀을 훔치고 마음을 식히는 이 명절은 ‘동류수두목욕(東流水頭沐浴)’의 줄임말이다. 동쪽으로 흐르는 맑은 물에 머리를 감아 액운을 씻어내고, 햇과일과 밀국수를 천신(薦神)으로 올려 농사의 안녕을 빈다. 유두의 물은 단순한 수분이 아니다. 그것은 여름을 버티는 힘이고, 내 안의 묵은 기운을 씻어내는 의례다.
유두절의 기원과 물의 의미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유두는 신라시대부터 전해지는 우리 고유의 풍속으로, 부정을 씻고 풍요를 기원하는 날로 여겨졌다. 이 날에는 약수에 머리를 감거나 폭포 밑에서 물맞이를 하며, 논밭에서는 농신제를 올리는 등 마을 공동체가 참여하는 고사가 행해졌다.
유두는 예로부터 ‘농사 명절’이라 불리웠다. 『농가월령가』'유월령' 의 구절을 인용한다. “삼복은 속절이요 유두는 가일이라, 원두밭에 참외 따고 밀 갈아 국수하여, 가묘에 천신하고 한때 음식 즐겨 보세.” 여름 작물의 수확이 시작되는 유두 무렵, 참외나 수박 같은 햇과일과 막 수확한 밀로 국수를 만들어 조상께 바치고, 논밭에 고사를 지내는 것이다.
유두절의 또 다른 면모는 그것이 물을 통한 속죄와 정화의 의례라는 데 있다. 동쪽으로 흐르는 물, 즉 생명과 재생의 상징인 물은 음기가 극대화되는 여름철에 양기를 보충하는 상징으로서 기능한다. 물은 흘러가되 멈추지 않고, 씻어내되 남기지 않는다. 유두의 물맞이는 그러한 물의 성격을 온몸으로 받아들이는 행위이자 여름을 통과하기 위한 민속적 통과의례이기도 하다.
유두의 음식문화: 밀과 물, 여름의 선물
이날의 대표 음식은 단연 ‘유두면’이다. 유두면은 원래 밀가루를 반죽해 구슬처럼 만든 일종의 누룩 형태로, 오색으로 물들여 액운을 막는 부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러나 『농가월령가』나 지역 민속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에 수확한 햇밀로 칼국수나 밀전병을 만들어 먹기도 했으며, 이를 ‘유두국수’라 부르게 되었다. 귀한 밀가루를 넉넉히 쓰는 날이었던 만큼, 그 자체로 여름 한철을 기념하는 사치였고 기원이었다.
김정숙 작가의 『열두 달 세시풍속과 절기음식』에 따르면, 보리개떡도 유두절의 주요 음식 중 하나다. 껍질이 섞인 보리가루를 그대로 반죽해 채반 위에 납작하게 펴 쪄내면, 검푸르고 우둘투둘한 개떡이 된다. 이름은 투박하지만, 땅의 기운이 그대로 느껴지는 맛이다. 무더운 여름에 단술과 함께 먹으면 속을 다스리기에 제격이다.
민간에서는 유두면과 더불어 수단(水團), 건단(乾團), 상화병(霜花餠), 미만두, 밀전병, 미수(米水) 등 다양한 여름 음식을 즐겼다. 특히 수단은 찹쌀가루로 만든 경단을 꿀물에 넣어 차게 먹는 음식으로, 한여름의 더위를 달래는 대표적인 절기 음식이었다. 수단의 투명하고 동그란 형태는 마치 물방울 같아, 그 자체로 유두절의 정화 의례와 감각적으로도 맞닿아 있다.
유두국수는 단순히 맛있는 여름 음식이 아니었다. 긴 면발에 담긴 기원은 장수, 화합, 평안을 상징했고, 밀가루가 귀하던 시절 이 음식을 만든다는 것은 곧 가족과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자 풍요의 선언이었다. 한 그릇의 국수 안에 담긴 이야기와 정성은 그 시대의 '복'의 정의를 대변한다.
유두의 고사와 공동체의 기억
한국민속대백과사전에 따르면, 그 외에도 참외나 수박 등 햇과일과 함께 밭에서 수확한 작물들을 신에게 바치고, 밀부침개를 논두렁에 올려 해충과 병충해를 막기를 비는 고사도 행해졌다.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 등지에서는 밀떡이나 송편을 물꼬에 두고 기도하며, 논둑에 꽂은 떡을 동네 아이들이 나눠 먹는 풍경도 있었다. 이 떡은 ‘유두알’이라 불렸다.
지역에 따라 유두제의 방식은 조금씩 달랐다. 어떤 마을은 새벽에 밭에 나가 부침개를 지지고 송편을 논에 놓았으며, 또 어떤 곳은 미수를 떠서 햇과일과 함께 바쳤다. 제물로 올리는 음식과 방식은 달라도, 그 근저에는 한 해의 농사와 가족의 안녕을 기원하는 간절함이 있었다. 유두는 절기 속의 민속이자 공동체적 연대의 날이었다.
절기 음식은 단순한 계절 식단이 아니다. 입맛을 살리는 한 끼를 넘어, 삶을 되새기고 기원하는 음식 문화의 한 장이다. 유두절은 그중에서도 특별하다. 물로 씻고, 떡으로 기원하고, 국수로 복을 나누는 여름의 의례. 오늘 저녁, 머리를 감고 국수를 삶아보는 건 어떨까. 나와 집안, 그리고 계절의 무사함을 빌며, 유두를 다시 맞이하는 것이다. 그 물맛과 밀면의 온기가 오래도록 계절을 감싸 안기를 바라며.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