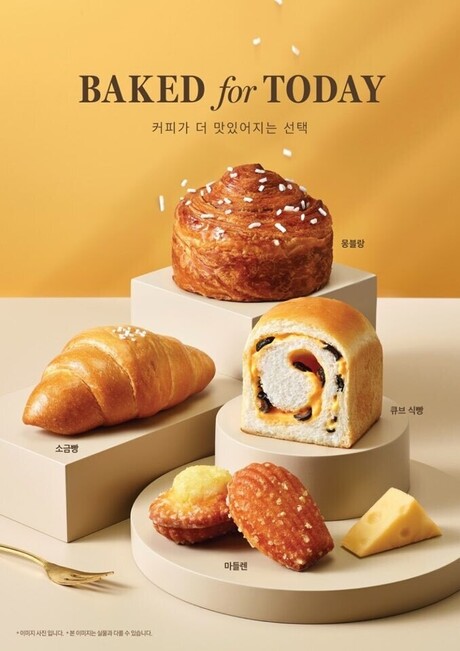바로 오늘 (7월 20일)이 바로 초복이다. 길게 줄 선 삼계탕집 앞, “초복·중복·말복 할인” 문구가 붙은 현수막, 그리고 시원한 닭국물을 들이켜는 사람들. 매년 반복되는 익숙한 풍경이지만, 그 속에 담긴 전통과 의미는 점점 흐려지고 있다.
복날은 단지 한 그릇의 음식으로 대변되기엔 너무 깊고, 넓다. ‘초복, 중복, 말복’ 삼복(三伏)의 유래는 어디서 비롯되었고, 조선시대에는 어떤 음식을 먹었으며, 우리는 지금 어떤 의미로 복날을 지키고 있는가. 그 뿌리를 묻고, 그 흐름을 좇으며, 오늘의 복날을 재조명해본다.
복날은 왜, 언제 생겨났을까?
복날(伏日)은 음력 6월과 7월 사이에 찾아오는 세 번의 절기인 초복(初伏), 중복(中伏), 말복(末伏)을 통칭한다. 각각 하지(夏至) 이후 세 번째 경일, 네 번째 경일, 입추(立秋) 이후 첫 번째 경일이다. 복날은 해마다 다르게 찾아오지만, 대부분 7월 중하순부터 8월 초까지 몰려 있다. 초복과 말복까지는 통상 20일의 간격이며, 드물게 중복과 말복 사이가 20일인 해는 ‘월복(越伏)’이라 부른다.
복날의 기원은 중국 진나라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사마천의 『사기(史記)』에 따르면, 기원전 676년 진덕공이 세 번에 걸쳐 제사를 지내고 백성에게 고기를 나눠주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이를 삼복의 시초로 본다. 양의 기운이 가장 약해지는 시점에 음의 기운을 극복하고, 기운을 보충하는 제사의 의미가 음식으로 전해진 것이다. 이후 복날은 민간과 궁중 모두에서 중요한 여름 절기로 자리 잡는다.
한국에서는 이러한 삼복의 개념이 조선시대 세시풍속으로 정착된다. 조선 헌종 때 학자 홍석모가 우리나라의 열두 달 행사와 그 풍속을 설명한 책『동국세시기』에는 복날의 풍속과 음식, 민간신앙 등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복날의 밥상 – 조선의 여름, 육식의 날
조선은 유교적 절제의 사회였다. 육식은 사치였고, 불필요한 기력 소모로 여겨져 통제됐다. 하지만 복날만큼은 예외였다. 복날은 “기력을 보충해야 하는 날”로 여겨졌고, 이 날만큼은 육식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먹을 것이 부족하던 이 시기, 복날 대표 음식은 개장국이었다. 지금의 보신탕으로, 가정에서 기르던 개를 잡아 푹 삶고 고추장 양념을 넣어 끓여낸 국물요리다. 선조들에게 개는 가장 오래된 가축이자, 중요한 단백질 공급원이었다. 농번기 고된 노동 속 체력을 보충하고자 여름철 복날을 중심으로 개고기를 먹는 풍속이 널리 퍼져 있었다.
반면 여성과 아이들은 수박, 참외 같은 수분 많은 과일로 더위를 식혔으며, 남성들은 산간계곡에 들어가 발을 담그며 탁족(濯足)을 즐기거나, 해변 모래사장에서 찜질을 하며 여름의 열기를 달랬다. 지역마다 방식은 달랐지만, 복날은 단순한 ‘밥 먹는 날’을 넘어 자연과 인간이 조화를 이루는 날이었다.
복날과 함께 전해 내려온 속신
복날은 금기와 주술, 농경의 리듬이 함께 깃든 절기였다.대표적인 속신으로는 “복날 시냇물에서 목욕을 하면 몸이 여윈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복날에는 아무리 더워도 목욕을 하지 않았으며, 만약 초복에 한 번 목욕을 했다면 중복과 말복까지 세 번을 꼭 채워야만 기운이 새지 않는다고 여겼다.
농민들 사이에서는 복날마다 벼가 마디를 하나씩 더 갖는다고 믿었다. 세 번의 복날을 지나 세 마디를 가지면 비로소 이삭을 패게 되므로, 벼의 ‘생애 리듬’도 복날과 함께 움직인다는 인식이었다.
충청북도 청산과 보은 지역에는 “복날에 비가 오면 청산과 보은의 큰애기가 운다”는 속담이 있다. 대추꽃이 복날 무렵 피는데, 비가 오면 열매 맺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지역은 대추 주산지였고, 흉작이 나면 결혼 비용도 줄어드는 일이 많아 속설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복날은 기후, 농사, 일상, 음식이 모두 엮인 민속의 총합이었다.
삼계탕의 탄생과 현대 복날의 얼굴
오늘날 복날 음식의 대표는 단연 삼계탕이다. 인삼, 황기, 대추, 찹쌀을 넣고 통닭을 푹 삶은 이 음식은, 영양가와 뜨끈한 국물로 여름철 체력을 보충해준다고 알려졌다.
하지만 삼계탕의 대중화는 의외로 근대 이후의 일이다. 1934년 방신영의 『조선요리제법』에는 인삼가루 한 숟가락을 넣은 닭국 요리가 나오지만, ‘삼계탕’이라는 명칭은 등장하지 않는다. 1951년 동아일보 기사에 “닭고음”이라는 이름으로 소개된 것을 보면, 1950년대 이후 물가 안정과 외식 시장 정착 과정에서 본격화된 것으로 보인다.
1970~80년대 양계산업이 급성장하면서 삼계탕이 대중화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한 ‘100대 민족문화상징’에도 포함됐다. 지금은 반계탕, 해물삼계탕, 전복삼계탕, 대나무통 삼계탕 등 다양한 변형도 등장했고, 레토르트 제품과 반조리식으로도 손쉽게 즐길 수 있다.
해외 셰프들과 한류 스타들도 삼계탕을 ‘여름의 대표 한국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한국 음식 중 하나로 손꼽힌다.
'보양'이라는 말, 여전히 유효한가?
‘보양’이라는 말은 더 이상 예전처럼 무게 있게 다가오지 않는다. 예전처럼 굶거나, 단백질 섭취가 부족했던 시절도 아니며, 오히려 현대 사회는 과잉섭취와 만성 피로, 체중 관리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렇다면 복날의 의미는 여전히 유효한가?
오히려 지금이 복날을 재해석할 시기다. ‘보양식’이 단순한 영양 보충이 아니라, 몸과 마음의 회복, 계절의 감각 회복, 공동체적 식탁의 복원이라는 문화적 의미로 확장될 수 있다면, 복날은 여전히 살아 있는 절기다.
최근에는 식물성 기반 보양식, 가볍고 지속가능한 여름 음식으로 복날을 맞이하는 이들도 늘고 있다.
고기를 줄이고 곡물, 버섯, 콩, 제철 채소를 활용한 새로운 복날 음식이 시대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날을 지킨다는 것 – 계절을 기억하는 일
우리는 왜 여전히 복날을 지키는가? 이는 단지 삼계탕 때문이 아니다. 복날은 몸이 계절을 기억하는 방법이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사회적 의식이다. 김장이 겨울의 문을 여는 의식이라면, 복날은 여름의 한가운데를 건너는 의식이다.
복날에 삼계탕을 먹는 것은 단순히 체력을 보충하는 행위가 아니라, 더위 속에서도 누군가와 함께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일이다. 그것이 한 마리 닭이든, 한 그릇의 팥죽이든, 한 조각 수박이든 말이다.
다시, 복날의 뿌리를 묻는다
삼복더위는 매년 찾아온다. 누군가는 에어컨을 켜고, 누군가는 바다로 간다. 하지만 어떤 이는 오늘도 장모님표 삼계탕을 그리워한다. 누군가는 계곡에서 발을 담그며, 누군가는 벼가 마디를 틔우는 것을 보며, 여름을 느낀다.
복날은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그 모습이 달라졌을 뿐이다.
우리가 복날을 지킨다는 건, 결국 한 계절을 기억하는 일이며, 한 사회가 지속되는 방식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제는 그 의미를 되살려, 더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여름의 복날을 다시 써야 할 때다.
그렇게 우리는, 여름 한가운데서 다시 복날의 뿌리를 묻는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