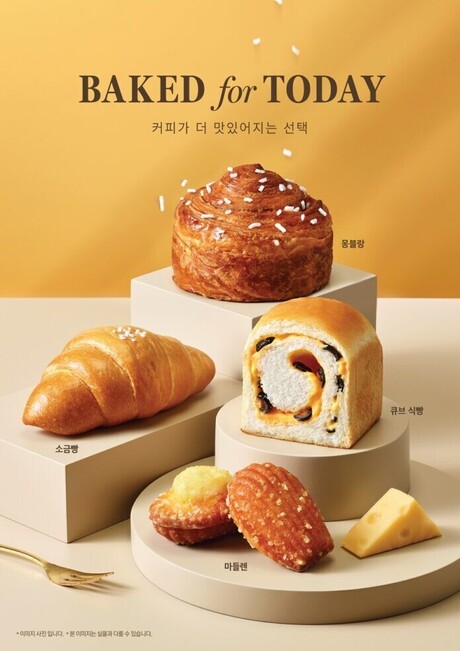[Cook&Chef = 이지헌 전문기자] 쇠고기를 곱게 다져 양념한 뒤 납작하게 빚어 구워내는 산적, 바로 섭산적이다. 한식조리기능사 실기 품목으로 지정돼 있지만 정작 대중에게는 낯선 음식이다. 산적이라 하면 흔히 꼬치에 꿰어 굽는 방식을 떠올리지만, 섭산적은 석쇠 위에 펼쳐 굽는다. 이름만 들어도 조리법의 특징이 드러난다.
섭(攝) : 유지하다, 잡다, 다스리다 / 산(散) : 흩어지다 / 적(炙) : 굽다
흩어지기 쉬운 고기를 잡고 유지해 구운 요리, 그것이 섭산적이다.
섭산적, 잔치와 배려의 상징
조선 궁중 문헌인 『궁중발기』, 『진찬의궤』 등에는 다양한 종류의 산적(육산적, 어산적, 송이산적, 파산적, 떡산적, 잡산적, 섭산적 등)이 언급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섭산적은 “쇠고기를 곱게 다져서 갖은 양념을 한 다음에 동글납작한 모양이나 두께 7㎜ 정도로 반대기를 만들어 구운 것이다. 노인과 어린이에게 좋은 음식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섭산적은 단순한 고기 요리를 넘어 궁중 잔치 음식이자 노약자를 배려한 음식이라는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있다.
고조리서 속 섭산적
섭산적은 소고기만으로 만들기도 하지만, 두부나 생선살을 섞어 빚기도 한다. 조리 방법이 비슷한 음식으로는 장산적과 떡갈비가 있다. 장산적은 섭산적을 잘라 장에 졸인 것이고, 떡갈비는 갈빗살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고기를 다져 양념해 구워낸다는 방식에서는 공통점을 보인다.
섭산적의 조리법은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하나는 다진 소고기에 양념을 더하는 전통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두부나 생선을 섞어 만드는 방법이다.
『조선요리제법』(1921)은 연한 고기를 잘게 다져 간장·기름·깨소금·후춧가루·파를 넣고 한참 주물러 반대기 모양을 만든 뒤 기름과 깨소금을 발라 굽는 법을 기록했다. 『우리음식』(1948)에서도 섭산적을 너비아니와 비슷한 음식으로 설명하며, 고기가 질길 때 다져 만든다고 했다.
반면 『이조궁정요리통고』는 소고기에 두부와 생선을 함께 다져 넣는 법을 소개했으며, 송이버섯 철에는 버섯을 다져 넣는 방식도 덧붙였다.
곁들임과 고명으로 즐긴 섭산적
섭산적은 곁들이 음식이나 고명으로도 즐겨 쓰였다. 흥미로운 점은 상추와의 조합이다. 『조선요리법』(1939)은 ‘상추쌈 절차’에서 상추쌈에 곁들이는 여러 음식을 소개하면서 섭산적을 그 가운데 하나로 기록했다.
또한, 『조선요리제법』(1921)에서는 떡국과 비빔밥에 섭산적을 썰어 얹어 고명으로 사용하고, 밀국수와 냉면에는 구운 섭산적을 으깨서 고명으로 올리는 방법을 전했다. 더 나아가 섭산적은 본래 ‘고기를 잘게 다져 빚어 구운 음식’을 뜻했기 때문에, 소고기가 아닌 다른 재료를 사용해도 같은 이름이 붙었다.
섭산적 만드는 방법
- 소고기는 기름기를 제거한 후 큰 덩어리가 없을 때까지 다진다.
- 두부는 껍질 부분을 썰어낸 후 면포에 넣고 으깨며 수분을 제거한다.
- 대파와 마늘을 다진다.
- 다진 대파, 마늘, 소금, 설탕, 후춧가루, 참기름, 깨소금을 섞어 갖은 양념을 만든다.
- 소고기와 두부는 3:1 비율로 준비한 후 갖은 양념을 넣고 섞은 후 치댄다.
- 원하는 두께로 펼친 후 칼로 정사각형 모양을 만든다.
- 석쇠를 달군 후 식용유로 코팅한 후 모양을 잡은 섭산적 반대기를 올린다.
- 중~약불에서 앞뒤 고루 굽는다. (젓가락으로 눌러봤을때 단단한 정도)
- 잣을 다져 잣가루를 만든다.
- 살짝 식은 섭산적을 부서지지 않도록 석쇠에서 조심히 떼어낸다.
- 정사각형 모양으로 썬다.
- 잣가루를 뿌린다.
섭산적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다. 흩어진 것을 하나로 모아내는 정성과 배려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오늘날의 식탁에서도 여전히 되새겨볼 가치가 충분하다.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