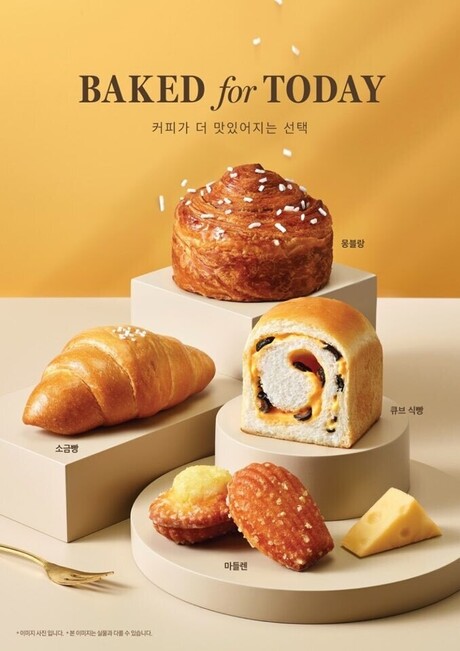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Cook&Chef = 이경엽 기자] 7월의 무더위는 갑작스럽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장맛비와 습한 공기로 짙게 눅눅해진 땅 위로 서서히 더위가 들이친다. 소서(小暑), 이름 그대로 작은 더위가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면, 열흘 보름 안에 대서(大暑)가 그 문을 활짝 연다.
오늘(22일)은 절기상 대서다. 대서는 24절기 중 열두 번째 절기로, 한 해 중 가장 무더운 날이자 여름의 정점이다.
절기상 대서는 단순히 ‘덥다’는 자연 현상에 머무르지 않는다. 농촌의 밭은 가장 뜨거운 햇볕을 받아 식재료의 당도를 끌어올리고, 부엌은 진한 땀 냄새 속에 보리밥과 강된장을 내놓는다. 절기란 시간의 표식이지만, 우리의 입맛과 생애주기, 그리고 음식 문화의 지도를 구성하는 표준이기도 하다.
소서가 예고하고, 대서가 완성하다
7월 초의 소서(小暑)는 장마와 맞물리며 더위의 초입을 알리는 절기다. 습한 기운이 가득하고, 모내기가 마무리되며, 퇴비를 장만하고 이모작을 준비하는 시기. 예로부터 "소서가 넘으면 새 각시도 모심는다"는 속담처럼 바쁜 농번기의 끝자락이다.
하지만 소서의 더위는 어디까지나 서막이다. 본격적인 농익음은 대서(大暑)에서 시작된다. "염소 뿔도 녹는다"는 말처럼 연일 이어지는 불볕더위, 땀이 줄줄 흐르는 계절. 장마전선이 늦게까지 머물면 폭우가 겹치고, 그렇지 않으면 ‘폭염주의보’가 매일같이 뉴스의 첫머리를 장식한다.
그러나 이 무더위 속에서도 농부들은 손을 멈추지 않는다. 김매기, 잡초 제거, 퇴비 작업, 열매 솎기… 하루하루는 바쁘고 소중하다. 바로 지금이야말로 결실을 키워내는 시간, 풍성한 밥상을 준비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여름의 절정에서 빛나는 식재료들
대서 무렵, 여름의 식재료는 그야말로 ‘절정’에 달한다. ‘여름의 맛’이라 불릴 수 있는 것들이 하나같이 이 시기를 기점으로 가장 맛있고 싱싱해진다. 단맛이 최고조에 달한 수박, 잡내 없는 풋고추, 아삭한 애호박, 통통한 옥수수, 그리고 밥의 무게감을 살려주는 보리까지.
한식진흥원에 따르면, “소서부터 대서까지의 시기는 농작물의 당도와 수확량이 동시에 최고조에 이르는 시기”이며, “이때가 여름 식재료가 가장 풍성하고 맛이 깊어지는 절기”라고 설명한다.
여름의 얼굴, 수박
수박의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로, 우리나라에는 고려 시대에 처음 들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허균의 『도문대작(屠門大嚼)』에는 홍다구가 개성에 수박을 들여왔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수박은 대서 무렵, 당도가 가장 높다. 물과 당이 절묘하게 배합된 이 시기의 수박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이라는 계절을 씹는 느낌을 준다.
붉은 과육을 동그랗게 퍼내어 얼음과 함께 낸 수박화채는 더위를 식히는 대표적인 여름 디저트다. 최근에는 수박을 주스로 갈아 냉동한 얼음을 넣는 방식으로도 즐긴다. 얼음이 녹아 싱거워지는 단점을 보완한 방식이다.
땀을 부르는 건강식, 보리
한때는 춘궁기를 버티기 위한 서민의 주식이었던 보리. 이제는 성인병 예방에 좋은 기능성 곡물로 다시 사랑받고 있다. 대서에는 보리가 제 맛을 내기 시작한다. 대표적인 보리 음식은 보리밥과 강된장. 땀을 흘린 여름날의 식욕을 자극하는 한 그릇이다.
한식진흥원은 보리에 대해, “과거엔 구황작물이었지만 지금은 건강식으로 자리 잡았다”며 “보리의 영양 성분은 여름철 지친 기력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밝혔다.
‘쌀보리’는 밥용, ‘겉보리’는 엿기름과 보리차용, ‘늘보리’는 꽁보리밥에, ‘찰보리’는 부드러운 식감을 원할 때 사용된다. 보리는 단일 식재료이지만, 쓰임은 입체적이다. 밥, 엿, 차, 간식, 술, 사료까지—보리는 농부의 삶과 도시인의 건강을 모두 아우른다.
밥상을 풍성하게, 애호박과 풋고추
애호박은 ‘국민 채소’라 불릴 만큼 식탁에서 빠지지 않는다. 대서 무렵 애호박은 수분을 가득 머금은 채로 단물이 배어나올 정도로 맛이 절정에 이른다. 찌개, 전, 볶음, 나물, 고명… 어디에도 어울린다. 비타민 A, C가 풍부하고, 소화가 잘되며, 특히 두뇌 건강에 좋다는 점에서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유익한 채소다.
풋고추는 한입 베어 물면 아삭한 식감에 청량한 매운맛이 감돈다. 된장에 찍어 먹는 ‘생식’ 문화가 자리 잡은 것도 이 시기의 풋고추 때문이다. 신미종(매운맛), 감미종(단맛)으로 나뉘며, 부각, 장아찌, 찌개용 등으로도 다양하게 쓰인다. 비타민 C와 철분, 칼륨도 풍부한 여름 채소의 핵심이다.
‘순금의 열매’, 옥수수
옥수수는 작황이 풍성하고, 손이 덜 가는 대표 작물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유래되어 16~17세기 무렵 조선에 들어온 이후, 주로 강원도 등 산간지대에서 재배되었다. 대서 무렵의 옥수수는 알이 굵고 단맛이 깊다.
한식진흥원은 “옥수수는 삶아 먹는 것 외에도 묵, 밥, 떡, 술 등 다양하게 조리할 수 있어 계절 식재료의 활용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최근에는 초당옥수수(生식 가능한 품종)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여름철 길거리 간식으로도, 캠핑 간편식으로도 식재료 이상의 역할을 하는 옥수수는 계절의 정서를 자극한다.
대서, 음식으로 삶을 되새기는 날
절기는 달력 위의 표시만이 아니다. 농부의 손끝에서, 요리사의 칼끝에서, 그리고 식탁 위 그릇에서 다시 태어난다. 대서란 절정의 열기 속에서도 삶은 다시 여물 수 있다는, 계절이 전하는 은유다.
수박화채 한 그릇, 보리밥에 강된장 한 수저. 이 간단한 여름의 한 끼는, 우리가 얼마나 계절과 호흡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상기시킨다. 그 어떤 고급 요리보다, 이 절기의 밥상이 우리를 더 가깝게 안아준다.
계절의 풍요? 그 이면도 살펴봐야
그러나 이런 풍요의 절기에도 어두운 단면은 있다. 최근 몇 년간의 이상기후와 폭염, 가뭄, 갑작스런 폭우는 농산물 수급 불안과 가격 폭등을 야기했다. 제철 수박 한 통의 도매가가 2만 원을 넘고, 애호박은 ‘금(金)호박’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다. 절기 음식이 삶의 리듬이었다면, 지금은 소비의 사치가 되지 않도록 제도적 뒷받침도 필요하다. 절기의 맛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농산물 유통의 정의로운 구조도 함께 논의돼야 한다.
대서는 더위의 끝자락이 아니다. 여름의 한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삶의 결을 붙잡는다. 제철의 식재료를 골라, 함께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식탁을 차리는 행위는 단순한 생존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삶을 존중하고 계절을 품는 문화의 실천이다.
오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린다면. 수박화채 한 그릇과 보리밥 한 공기에, 대서의 의미를 담아보자.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