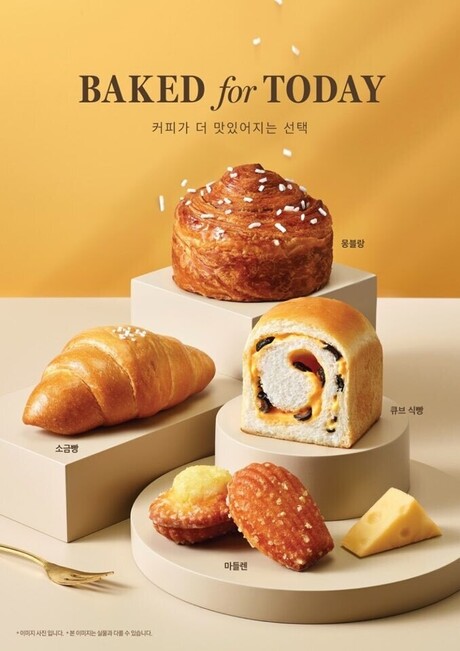[Cook&Chef = 이지헌 전문기자] 깨강정은 주재료인 깨(흑임자·백깨)와 청·엿기름 등을 섞어 굳혀 만드는 전통 한과(韓菓)의 한 종류이다. 고소하고 달콤한 맛이 특징이며, 만드는 과정이 복잡하고 손이 많이 가 궁중이나 양반가에서 귀하게 여겨졌다. 오늘은 깨강정의 근본인 강정과 깨강정 조리법에 대한 이야기이다.
의례의 과자에서 일상 간식으로
강정은 약과·다식과 함께 잔칫상과 제사상, 큰상에 오르던 대표 한과다. 찹쌀가루를 술로 반죽 모양을 낸 뒤 그늘에 말렸다가 기름에 튀겨 꿀과 고물을 묻혀서 만든다. 고물의 재료나 모양에 따라 콩강정 ·승검초강정 ·깨강정 ·송화강정 ·계피강정 ·세반강정 ·방울강정 ·잣강정 ·흑임자강정 등으로 나뉜다.
강정의 기원은 중국 한(漢)나라 시기 음식인 한구(寒具)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시기에는 찹쌀가루를 섞어 반죽한 후 특정 모양으로 튀긴 뒤 꿀이나 물엿에 찍어 먹는 형태였다.
고려시대에는 “유밀과”라는 이름으로 널리 퍼졌다는 설이 있다. 삼국시대에도 가야에서는 "과(餜)"라고 불리는 강정으로 추정되는 간식이 기록되었는데, 한구가 “양념을 찍어 먹는 형태”였다면, 과는 “미리 양념이 된 형태”였다.
고려시대 강정은 잔치, 제사, 특히 세배상에 반드시 오르는 과자였다. 『동국세시기』에서는“오색 강정이 잇는 설날과 봄철에 인가(人家)의 제물로 실과행렬(實果行列)에 들며, 세찬으로 손님을 대접할 때 없어서는 안될 음식”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조선 후기 빙허각 (憑虛閣) 이씨가 1809년에 저술한 가정 살림 백과사전 규합총서(閨閤叢書)에서는 강정을 “견병(繭餠)"이라고도 불렀다. 이는 강정의 모양이 누에고치와 닮았기 때문이다. 또한 “강정이 씹어 날림에 십 리를 놀래더라”라는 표현으로 바삭한 식감을 묘사했다.
현대에 들어 강정은 간식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과거에는 만드는 과정이 오래 걸리고 복잡해 오랫동안 양반 계층의 전유물이었다.
닭강정은 전통한과일까?
‘닭강정’이 옛 ‘강정’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발전하였다는 흥미로운 해이 있다.
양념치킨은 고추장·케첩·간장 기반의 액체형 양념을 고기에 버무리지만, 닭강정은 조청·꿀·물엿처럼 당분 농도가 높은 시럽형 소스를 사용한다. 이 소스를 팬에서 걸쭉하게 졸인 뒤 뜨거울 때 두툼한 튀김옷의 고기를 넣고 뜨거울 때 코팅한다. 이 과정에서 조청이 굳으면서 표면이 단단해지고 광택이 나게 된다. 이 코팅 방식은 전통 한과 ‘강정’의 제작법과 유사하다.
깨강정 만드는 방법
1. 깨는 약한 불에서 통통해질 때까지 볶은 후 식힌다.
2. 물에 가볍게 씻은 후 체에 받쳐 물기를 뺀다.
3. 프라이팬에 시럽용 물, 설탕, 물엿, 꿀을 넣고 끓인다.
4. 시럽이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인 후 절반 정도가 될 때까지 졸인다.(주걱으로 떠서 떨어뜨려 보았을 때, 방울로 떨어질 정도)
5. 불을 끈 후 깨를 넣고 빠르게 섞는다.
6. 종이호일 위에 깨강정 반죽을 부은 후 식용유를 바른 뒤 0.5cm 정도 두께로 밀대 혹은 손으로 빠르게 밀어 편다.
7. 깨강정이 식어 굳으면 원하는 모양으로 썬다.
TIP. 참깨, 검은깨, 들깨를 사용해 다양한 색감과 맛을 낼 수 있으며, 견과류를 같이 경우 재미있는 식감을 줄 수 있다.
—
참고 한식진흥원 『맛있고 재미있는 한식이야기』(강정), 『동국세시기』, 빙허각 이씨 『규합총서』(1809), 전통문화포털 ‘닭강정이 전통한과?’
[저작권자ⓒ 쿡앤셰프(Cook&Chef). 무단전재-재배포 금지]